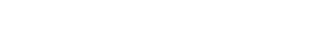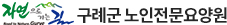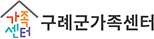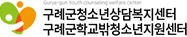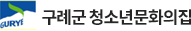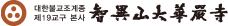흑매당(黑梅堂)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07 13:38 조회5,859회 댓글0건본문
흑매당(黑梅堂)
이양주
꽃에 베이다니. 꽃이 사람 마음을 베이게 한단다. 화엄사에 사는 홍매 한 그루가 하도 붉어서 검은 색이 돌아 흑매란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보는 순간 마음이 쓰윽 베인다고 한다. 그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나무가 쑤욱 들어섰다.
조선 숙종 때 계파선사가 각황전(覺皇殿)을 중건하면서 기념으로 심었다는 홍매 한 그루. 어리고 착한 뿌리 하나가 터를 잡아 삼백년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 굴곡진 세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다. 기나긴 세월을 제 자리를 지키며 견뎌낸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당장이라도 달려가 오래된 삶에게 묻고 싶었지만 꽃의 계절은 이미 지난 뒤였다.
마침 지리산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친구 하나가 좀 더 산 가까이 살고 싶어 아예 지리산 자락 화엄사에 가방을 풀었다는 기별을 보내왔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그녀였지만 자신의 색깔과 향기에 맞는 삶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그녀의 어두운 낯빛이 떠올랐다.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면 말 수가 적은 그녀는 별 설명 없이 꼭 한번 오라는 말로 대신했다. 금방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품은 지리산에 나도 안겨 잠을 청하고 싶었지만 꽃 피는 봄날을 위해 아껴두었다.
겨울 끝자락 쯤 그녀에게서 우편물이 날아왔다. 봉투의 입을 열자 템플스테이 초대권과 함께 붉은 꽃잎이 맑고 푸른 바람에 흩날리며 쏟아져 나왔다. 안 그래도 각황전 옆 홍매가 피면 가려고 했다며 홍매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곧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개화의 시기는 아직 멀었는데 설렘에 마음속은 벌써부터 꽃 천지다. 착한 그녀가 부산 피우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꽃은 맘도 모른 채 입을 꼭 닫고 있다며 푸념을 한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겨울은 참으로 더디 가고 기다리는 봄은 퍼뜩 오지 않는다. 올해는 유난스레 겨울이 더 긴 것 같다. 드디어 들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매 부처님 깨어났어요.”
절간에 사는 그녀의 눈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나보다.
산문을 들어서는데 마음이 먼저 앞장선다. 연인을 만나러가는 심정이 이럴 것이다. 이런 떨림 가져본 지 언제였던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흔들림이다.
인간의 몸을 빌려 난 부처의 피가 저렇게 붉었을까. 수백 년을 법음(法音) 법향(法香) 속에 살아서일까, 늙은 가지가 비틀어지고 굽었으나 참으로 멋진 자태를 지녔다.
닮고 싶은 인간모델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꽃이라도 닮고 싶은 것일까. 홍매나무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었다. 근래에 종무소로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이 홍매의 개화를 묻는 거라고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홍매를 만나고 있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한 풍경 속에 서 보는 사람들, 홍매를 화폭에 담기 위해 삼 년 째 먼 길을 달려 왔다는 화가도 있었다. 꽃이 피는 건 잠시라며 때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우리 인생도 꽃 같은 순간은 참으로 짧지 않은가. 그나마 잠시라도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경험해본 사람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도 나무 아래 서성인다. 마음이 붉은 꽃가지 위에 앉는다. 봄날 매화 가지에 앉고 싶은 것이 어찌 사람 마음뿐이겠는가. 하늘도 구름도 머물러 있다. 새와 나비들도 다녀갔으리라. 꽃은 저 혼자 저절로 피는 게 아니다. 저를 스쳐간 수많은 인연이 있었기에, 공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쉽게 살지 않았다. 모진 계절과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피워낸 덕의 꽃이다. 요란을 떨지도 않는다. 교만한 모습도 아니다.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제 할일을 다 했을 뿐이라는 듯. 칭찬하려하나 그런 것엔 이미 초연한 모습이다. 일찍이 보여주려 한 삶이 아니었다.
홍매 곁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방사에 들어 짐을 풀었다. 산사의 밤은 빨리 깊어진다. 아홉시가 되자 하루를 다 내려놓고 편히 자라고 범종이 울린다. 이 밤을 몹시 기다렸다. 달빛을 온 몸으로 받으며 서 있을 월매(月梅)의 암향(暗香)을 맡으며 함께 춘정(春情)을 나누고 싶었다. 헌데 야속하게도 비가 내린다. 잠을 청해보는데 문살에 매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빗소리가 창호를 적신다. 몸을 일으킨다. 툇마루 끝에 서 있는 우산 하나가 눈에 띄지만 홍매랑 우산 하나로는 함께 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빗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천오백년 고찰도 나무들도 꽃들도 무정 유정물이 다 비를 받아들이고 있다. 밤에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수도자를 닮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비를 맞으며 어둠 속에 홍매가 홀로 서 있다. 다가가 손을 얹는다. 차갑게 젖어있다. 춥냐고 물어본다. 사람은 인정에 늘 흔들리지만 홍매는 차가움 뜨거움과 같은 상대적인 경계는 이미 벗어났기에 초연한 모습이다. 당당하고 붉은 기운이 무척이나 선연하다. 흑매(黑梅)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것만 같다. 내 피도 이만큼 붉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을 아니 단 한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꽃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내생이 있어 다시 이 세상에 와 몸을 받아야한다면 화엄사 흑매면 좋겠다고 발원한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자세를 생각한다. 발걸음을 옮긴다. 잠든 여러 전각들이 다가왔다가 멀어져간다.
뒤돌아본다. 저기 어둠 속에 법당 하나 우뚝 서 있다. 이 세상 어느 법당이 저리 붉을 것인가. 나는 흑매당(黑梅堂)이라 이름 붙인다. 내 맘속에 살아 숨 쉬는 법당 하나 소중히 앉힌다.
화엄사에 드림
약력 ;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회원
< 2014 젊은 수필 > 작가로 선정
제 8호 인간문화재 이수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