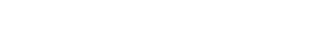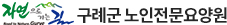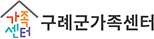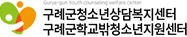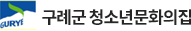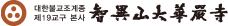절에서의 2박3일, 완벽한 평안을 만나다(경향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26 16:34 조회9,229회 댓글0건본문
온전히 쉼과 회복의 시간이었던 화엄사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숙소에서 본 지리산 전경 / 김서영 기자
사람으로 살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다. 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 고민에 고민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명제가 저주처럼 느껴진다. 왜 인간의 삶은 이리도 번뇌의 연속인 걸까? 피곤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새해로 본격 나아가기 전에 묵은 피로를 벗겨내야 했다.
문득 오대산 명상마을에서 기절이라도 한 것처럼 잠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비록 하룻밤이었으나 2021년 최고의 ‘꿀잠’이었다. ‘아예 절에 묵는다면 어떨까’에 생각이 미쳐 템플스테이를 검색하다가, 구례 화엄사 사찰음식이 맛있다는 추천평을 봤다. 지리산 자락에 포옥 둘러싸인 화엄사에서라면 속세를 완전히 떠나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각종 도상으로 형상화한 공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다분히 역설스럽다. 지친 중생에게 템플스테이는 고해를 헤쳐나가는 뗏목으로 다가왔다.

구례 화엄사 템플스테이 숙소 입구 / 김서영 기자
■절에 가면 뭐 하니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발우공양, 108배, 등산 등 뭔가를 ‘했느냐’였다. 템플스테이는 체험형과 휴식형으로 나뉜다. 오롯이 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휴식형을 선택했다. 흔히 떠올리는 각종 활동은 체험형에 해당한다. 체험형조차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마침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108배조차 운영하지 않는다기에 더 가뿐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 일을 굳이 꼽자면 절을 산책하고, 근처 암자를 다녀왔다. 화엄사(사적)에는 조선 숙종 때 재건한 각황전(국보)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 만들어 남한에 남은 석등 중 가장 큰 석등(국보)이 각황전 앞에 있다. 각황전이 절의 중심인 대웅전(보물)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점이 독특하다. 도보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연기암에 올라서니 저 멀리 섬진강이 내려다보였다. 연기암은 신라 진흥왕 때 화엄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인도 연기 법사의 이름을 딴 암자다. 화엄사에서 샛길로 계단을 올라 사사자삼층석탑(국보)에 다다랐다. 경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보이는 노고단이 지리산에 왔음을 실감케 했다.

네 마리 사자가 탑을 받치고 있는 사사자삼층석탑(왼쪽)과 각황전과 각황전 앞 석등 / 김서영 기자
템플스테이 숙소 마당으로 돌아오니 삼색 고양이가 반긴다. ‘보리’라고 했다. “고양이를 방에 들이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길래 의아했는데, 보리랑 놀다 보니 이해가 됐다. 제가 먼저 다가와 머리를 부비고, 벌러덩 드러누워 애교를 부리고, 방문 앞까지 따라오는데 이 유혹에 못 이겨 모른 척 방에 들여보낸 이가 분명 있었으리라. 사람을 피하기 바쁜 도시 고양이와 달리 제 구역에서 유유자적하는 절 고양이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템플스테이의 큰 장점은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애써 호캉스를 가더라도 ‘뭘 먹을까’란 과업을 떨쳐낼 수 없었는데, 템플스테이에서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화엄사에선 아침 공양을 오전 5시 50분에, 저녁 공양을 오후 4시 50분에 했다. 첫 공양 이후 적은 일기를 펼쳐보니 “재료가 신선하고 밥과 반찬에서 윤기가 난다”며 호들갑을 떨어 놨다. 그만큼 맛있었다. 식단도 공양마다 바뀌었다. ‘속세의 맛이 그리워질지 모른다’며 비장하게 사들고 간 마카롱 2개는 끝내 방구석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볕 드는 곳에서 식빵을 굽고 있는 보리 / 김서영 기자
절의 하루는 바깥세상보다 짧았다. ‘한창때’인 오후 5시 45분쯤, 스님들이 북과 종을 쳤다. 절의 일과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다. 속세에선 아직 퇴근도 못 한 시각이다. 나지막하지만 강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듣자니 몸속까지 둥둥 울리며 다른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내려가면 경내는 온통 고요해진다. 그때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이 주는 평화 속에 잠기기만 하면 된다.
■단절의 미학
첫날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잤다. 둘째 날은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완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일찍 잤더니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아직 해가 안 떠서 하늘에 별자리가 다 보였다. ‘아침’ 공양이란 말이 무색했다. 별들을 좀 세다가 캄캄한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잤다.

사사자삼층석탑에서 내려다 본 화엄사 / 김서영 기자
템플스테이 동안 가장 지키려고 노력한 부분은 스마트폰과의 단절이었다. 화엄사로 올라가는 내내 ‘2박3일만큼은 스마트폰과 멀어져 보자’고 다짐을 거듭한 터였다. 사진을 향한 집착만은 내려놓지 못해 산책할 때 결국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말았지만, 잘 때는 철저히 멀리했다. 일찍 잠든 사이 친구들이 카카오톡에서 웃긴 대화를 하지 않을지, 웹툰 다음 화가 올라오진 않을지 살짝 걱정스럽긴 했다. ‘눈 딱 감고’ 스마트폰을 멀찍이 두고, 말 그대로 냅다 눈을 감았다. 무의미한 화면 터치를 없애는 대신 숙면을 얻었다.

절의 하루는 종소리로 시작해 종소리로 끝난다. / 김서영 기자
죄책감 없이 쉬어본 게 얼마 만이던가. 일, 인간관계, 일상의 잡다한 고민에서 벗어나 맘껏 마음의 평화를 누린 게 과연 언제였던가. 떠올려보니 까마득했다. 스님과 했던 이야기도 강박과의 이별 방법이었다.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는 행태를 거듭하곤 했다. 어릴 때부터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있는 습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자신이 일평생 시달린 우울증을 ‘검은 개’에 빗댔다. 그는 “평생을 검은 개가 나를 따라다녔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검은 개’가 있다. 잡념과 걱정, 불교 용어로 ‘번뇌’가 나에겐 ‘검은 개’다.
화엄사에서 보낸 2박3일은 오래 묵은 ‘검은 개’를 마주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난 시간이었다. 당시 일기에 적은 “더하고 뺄 것 없는 완벽한 평안”이란 표현은 순수한 진심이었다. 그만큼 절이 주는 안정감과 경건함이 몸과 정신을 바로 세우게끔 도왔다. 풍경이 짤랑대는 소리, 대나무숲에서 느끼는 바람, 고요한 경치처럼 부러 찾아나서야 하는 안정제가 사찰에는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었다. 그 덕분에 충만했다.
https://www.khan.co.kr/travel/national/article/202201230810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