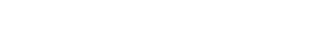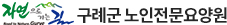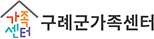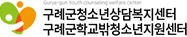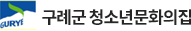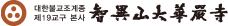무등일보 - "코로나가 일깨워준 '멈춤', 때론 역설에 진리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13 09:30 조회6,696회 댓글0건본문
[영상] "코로나가 일깨워준 '멈춤', 때론 역설에 진리가 있다"
마스크를 쓰니까 어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시원한 호흡과 상쾌한 공기가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 있는 답답함이
마스크 없는 자유로움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역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급히 가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뒤처진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혼자 갈 때도 멈춘다고 해요.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요."
덕문스님은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멈춤'이다. 달리기만 하면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는 때로 멈춰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멈춤은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지요. 가기 위해 멈춰야 한다, 역설(逆說)입니다. 진리는 역설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를 보고 "마스크를 쓰니까 어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시원한 호흡과 상쾌한 공기, 그런 소중함이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 있는 답답함이 마스크 없는 자유로움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역설"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역설입니다. 코로나는 멈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는 것은 버립니다.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다 남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외수 선생이 그랬다지요? 지갑에 돈 마르는 것은 알아도 사람 사이에 정 마르는 것은 모른다고요. 만보기를 차고 하루 만보를 걷는 사람들이 물은 배달시켜 먹는 세상입니다. 노약자라면 몰라도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마실 생수를 남에게 시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다가 택배노동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사(急死)해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아등바등, 사막처럼 바짝바짝 말라 갑니다. 오염된 물과 황사 섞인 공기에,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어느덧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는 자업자득이고 필연이라고 밖에 달리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화엄사는 부산했다. 사사자 삼층석탑 '회향식'과 괘불탱 '야단법석'의 와중이라 가을 산사는 장바닥처럼 북적였다.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35)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세운 탑으로, 불국사의 다보탑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이형(異形)석탑이다. 탑을 해체 보수하여 재정립한 회향식이 9월28일 열렸다. 각황전 뒤편 언덕 제자리에 10년 만에 다시 선 석탑은 갓 목욕을 마친 여인처럼 청고한 모습 그대로였다. 사흘 뒤에는 '화엄, 길 위에 서다'라는 이름의 문화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가 야외에 단을 차려 법문을 듣는, 말 그대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야단에는 불상을 세울 수 없으니 걸개그림으로 대신하는데 그것이 '화엄사영산회괘불탱'(국보 301)이다.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높이 12m의 조선후기 걸작 탱화이다. 10월1일부터 사흘간 야단법석 때만 볼 수 있는 진품이다. 화엄사는 초봄 흑매 필 때도 좋지만 가을축제에 맞춰 오면 '5대 국보'(사사자삼층석탑·각황전·석등·영산회괘불탱·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를 다 볼 수 있어 얻는 것이 많다. 석등은 통일신라 때 만든 높이 6.4m로 지구상에서 제일 크다. 석등 뒤의 각황전은 우리나라 최대 목조건축물이다. 8세기 지어진 '장륙전(丈六殿)'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702년 다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석등과 각황전은 제짝이 아니다. 저 석등과 어울리려면 뒤의 불당이 더 커야 하는 것이다. 본래 장륙전은 3층이었다고 한다. 왜 저렇게 큰 석등이 화엄사에 서 있을까? 절에 와서 휭 둘러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오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라는 유홍준 선생의 말씀 따라 나는 의문을 내어 스님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답이 간단하다. "산이 크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산역이 800리에 이르며, 산에 들면 지혜를 얻어간다는, 이 산이 지리산 아닌가!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라고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면서 걱정해야 하는 일곱가지 일이 '개문칠건사'입니다. 중국 남송시대 오자목이란 사람이 한 말인데, 매일 먹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땔감, 곡식, 차, 기름, 간장, 소금, 식초를 말합니다. 그것이면 족(足)하지요. 밥을 지으려면 쌀 씻고 불 때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전기밥솥에 할 것인지, 압력밥솥에 할 것인지, 쌀은 수돗물로 씻고, 앉히기는 생수로 할 것인지, 잡곡을 섞을 것인지, 백미로만 할 것인지, 그러다가는 해 넘어가고 말겠지요. 중국 선종의 8대 조사 마조스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보낸 세월이 어언 30년인데, 이제야 겨우 간장과 소금 걱정은 덜게 되었다고. 일곱 중에 겨우 둘 덜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묻는 바람에 "걱정이 다섯 남았다는 뜻"이라고 내가 답했더니, 두루 한바탕 웃고는 스님이 말을 잇는다. "한 솥 가득 끓인 국을 다 먹어봐야 압니까, 한 숟가락이면 맛을 알지요.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열로도 부족한 사람이 있지요. 마조스님은 일곱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은데 있지 않아요." 듣고 보니 이 또한 역설이다.

덕문스님은 강진에서 나서 광주에서 컸다. 대학진학의 열망은 컸지만 가난에 쫓겨 출가했다. 어느 저녁 송광사로 가려고 터미널에 갔는데 마침 송광사 행 막차는 떠나 버렸고, 화엄사 행 막차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화엄사로 갔고 그길로 출가했다. 벌써 40여년 전의 일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강원과 선방을 오가며 잔뼈가 굵었다. 동화사 등 여러 사암의 주지소임을 거쳐 지금은 화엄사 주지로 살고 있으니, 이판과 사판을 두루 섭렵한 '이판사판(理判事判)'이다. 덕문스님은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했다. 1987년 정부가 절 땅에 도로를 내면서 그 대가로 제시했던 당근이 '입장료(1600원)'다. 스님은 상생을 위해 자기 것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30여년의 묵은 갈등을 해소했다. 재작년 여름 폭우로 구례지역 1100가구가 이재민이 되었을 때 절에 임시대피소를 차리고 사람들 뒷바라지를 했다. 또 스님들을 다 모아 이끌고 피해복구 현장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유혈사태가 터졌을 때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맨 처음 '미얀마 지지성명'을 낸 곳도 화엄사다. 덕문스님의 이런 깨어있는 생각과 상생의 실천들이 종단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바람이 되고 있다.
봄은 들에 먼저 피고, 가을은 산에 먼저 물든다. 산벚나무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 산사에 앉아 마시는 한 잔의 차 맛, 그것도 차 '시배지(始培地)'에서 마시는 차 맛은 역시 다르다. 9세기 신라 대렴공이 중국에서 차 씨를 가져와 우리나라에 처음 재배한 곳이 화엄사 입구 장죽전(長竹田)이니, 이 차에는 천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는 셈이다. 화엄사 차는 산내암자 구층암의 덕제스님이 덖은 것으로, 전부 야생차다. 열 번을 우려도 깊은 맛과 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님, '화엄(華嚴)'이란 무엇입니까?"
"화엄사에서 화엄을 묻네요. 화엄경은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경전이지만, 한 마디로 하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또 역설이네요"
"그렇지요, 역설입니다. 재작년 겨울이 유독 따뜻했어요. 겨우내 눈 한번 내리지 않았는데 지리산에 살면서 처음 봐요. 그러더니 이듬해 봄 코로나가 돌더군요. 자연의 이치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디다. 내가 나고, 네가 너면 둘이지요? 그런데 나를 지워버리면 둘이 아니지요? 그 지워버림이 무아(無我)입니다. 욕심내고 고집부리는 내가 없어져서, 무아가 되면 둘이 아닌 불이(不二)입니다."
"불이문이 그것이네요"
"절에서 봤지요? '불이문'이 그 뜻입니다. 독수리나 매는 강하고 사나운 맹금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리는 나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독수리와 매는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이에요. 오리는 집오리도 많고 강가에 가면 청둥오리 검둥오리 쇠오리 원앙오리 등등 떼 지어 다니지요. 오리가 저렇게 번식하며 살아남은 비결이 뭘까요? 오리가 한 마리씩 다니는 것 봤어요? 상생입니다. 원앙(鴛鴦)이라는 말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협업과 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오리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생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생은 내 것을 덜 챙기는 데서 옵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말을 타고 달릴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말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볼 때 보입니다. 무아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화엄사에서는 지리산의 한쪽 면 밖에 안 보입니다. 땀 흘려 정상에 올라가야 북쪽이 보이지요. 역설의 뒷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아를 깨닫고 실천하려면 무수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무아가 되면 드디어 너와 나는 둘이 아닌 '불이'가 됩니다. 그것이 화엄입니다. 대동세상, 화엄세상 하지요?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다. 그것이 화엄입니다."
화엄, 알 듯 모를 듯하다. 내 것을 덜 챙기는 일이라는 말이 남는다. 차가 식어 스님이 다시 따라준다. 입 안에 남는 차의 뒷맛이 달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좀 더 나아질까요?"라고 물었더니 스님은 "승풍파랑(乘風波浪)"이라는 말로 맺었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듯이, 코로나를 넘는 길은 오직 화엄"이라면서 "화엄정신이 희망"이라고 했다. 이광이시민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